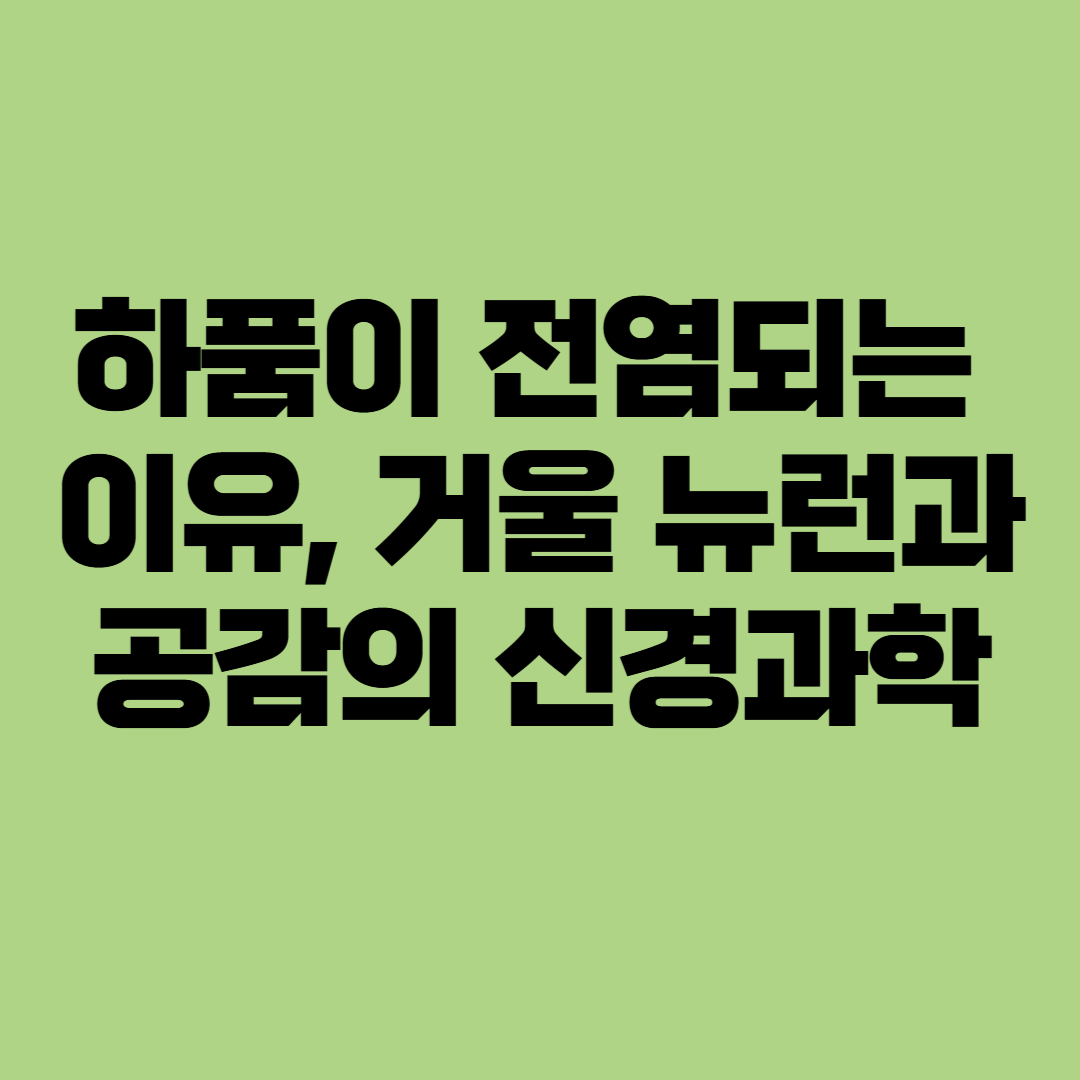하품이 전염되는 이유, 거울 뉴런과 공감의 신경과학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하품이란 게 참 신기하다. 어느 날은 혼자 있을 때도 터져 나오지만, 누군가 옆에서 입을 벌리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 하게 된다. 얼마 전 우리 가족이 모두 같은 타이밍에 하품을 하며 웃음을 터뜨렸던 날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하품이 왜 이렇게 번질까 하는 궁금증에 사로잡혔다. 단순히 피곤해서일까, 아니면 마음이 닮아 있기 때문일까.
하품의 연쇄 반응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족이 거실에 모였던 어느 저녁. TV에서는 잔잔한 다큐멘터리가 흐르고, 나는 소파에 기대 앉아 한숨을 돌리고 있었다. 무심코 터진 내 하품 하나가 시작이었다. 아내가 곧 따라 했고, 큰딸과 둘째, 막내까지 차례로 입을 벌렸다. 그 순간 모두가 동시에 피곤했던 하루를 웃음으로 덮었다.
그날은 유난히도 묘한 일체감이 느껴졌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치 뇌가 같은 신호를 주고받는 듯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에서는 하품이 단순한 피로 반응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 작용의 일종이라 설명한다. 즉, 하품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반응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단순한 피곤함 속에서도 따뜻한 연결이 느껴졌다. 하품 하나가 가족의 리듬을 맞추는 작은 언어 같았다.
거울 뉴런의 역할
이후 나는 하품의 전염이란 주제에 빠져들었다. 검색을 하다 발견한 단어가 바로 거울 뉴런이었다. 1990년대 이탈리아 파르마대 연구진이 원숭이 실험을 통해 발견한 이 세포는, 다른 존재의 행동을 보았을 때 마치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뇌가 반응하도록 만든다.
이후 인간에게도 같은 구조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누군가가 웃으면 나도 미소가 지어지고, 슬픈 장면을 보면 눈물이 맺히는 이유. 바로 이 거울 뉴런 덕분이다.
2023년에 진행된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의대 공동연구는 하품이 단순히 산소 부족이나 피로 때문이 아니라 공감 회로의 작동 결과라고 분석했다. 즉, 뇌가 타인의 피로와 감정을 감지하며 함께 쉰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던 산소 부족설은 이미 여러 실험에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혀졌다. 오히려 하품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쉽게 전염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쯤 되면 하품은 생리적 반응이 아니라 정서적 연결의 표현이라고 보는 편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가족 속 공감의 신호
그날 이후에도 그런 순간은 이어졌다. 늦은 밤, 둘째가 공부하다 하품을 하면 아내가 따라 하고 막내가 엄마도 졸려 하며 장난스럽게 웃는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하품이 단순한 피로의 표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같은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진다. 큰딸이 하품을 하면 둘째가 따라 하고, 막내가 흉내를 내며 깔깔 웃는다. 그 모든 장면이 피곤함 속에서도 미소를 짓게 한다.
공감은 꼭 거창한 말이나 행동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다. 하품처럼 사소한 몸의 반응 속에서도 이미 마음은 서로 닮아 있다.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론
하품은 단순히 졸림의 표시가 아니다. 그 안에는 뇌가 보내는 공감의 신호가 숨어 있다. 서울대병원과 1990년대 파르마대 연구가 증명했듯 하품은 타인의 감정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다.
가족이 함께 하품을 터뜨리던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말없이 이해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하품이 터질 때마다 왠지 모를 따뜻함이 마음을 감싼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하품을 따라 한 적이 있나요? 그 순간, 당신의 뇌도 아마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공감하고 있었을 겁니다.